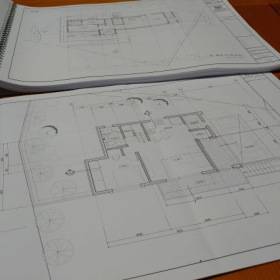전원생활 5년 만에 공들인 잔디 마당 갈아엎은 이유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남자의 집짓기] 땅은 도망가지 않는다
“전원주택을 왜 찾느냐”고 물으면 파란 잔디가 깔린 마당이 있는 집에 살고 싶어서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5년간 공들여 가꾼 잔디마당을 갈아엎었던 경험담을 들려주면 “정말이냐?”며 기가 팍 죽는다.
20여년전 처음 전원주택을 지어 시골로 내려갔을 때 필자도 제일 먼저 마당에 잔디를 깔았다. 처음에는 요령을 잘 몰라 촘촘하게 심다가 이웃의 훈수를 받아 띄엄띄엄 심는 등 중구난방으로 심은 탓에 잔디가 고르게 나지 않아서 그 사이로 잡초가 먼저 올라왔다. 급한 마음에 마당을 잘 고르지도 않아서 잔디 심는 일보다 잔돌을 골라내는 일이 더 힘들었다.

■“1년은 황토마당을 밟고 견뎌보라”
어쨌든 100평 가까운 넓은 마당에 잔디를 다 깔기는 했는데 고생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첫해 겨울을 보내고 봄이 오자마자 잡초들의 역습이 시작된 것. 본래 논이었던 땅인지라 잡초씨가 깊이 박혀 있었던 데다 초기에 잡초를 제거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좀 과장하자면, 뽑아내고 돌아서면 다시 올라오는 잡초들의 역습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마당을 갈아엎고 재정비하기로 했다. 잡초씨가 박혀 있는 땅에는 깨끗한 산흙을 트럭으로 수십대 실어와 복토(覆土)를 하고 처음부터 잡초가 올라올 틈을 주지 않고 잔디를 촘촘하게 심었다. 무엇보다 잔디 마당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문 쪽은 자갈로 깔았다. 5년을 살아 보고 나서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잔디마당이 어느 정도인지 분수를 알게 된 것이다. 150평 대지가 잠실운동장보다 더 버겁다는 것도 그 때 알았다. 전원주택 취재를 하러 다니면서 초심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고생담도 ‘잔디의 역습’이었다. 그 중에는 마당을 아예 시멘트로 덮은 경우도 꽤 있었다. 콘크리트가 싫어서 전원으로 내려와서 그게 무슨 짓이냐고 하겠지만,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잔디 가꾸는 일을 길게 늘어놓는 이유는, 전원주택지로 얼마만한 땅을 확보할 것인지 욕심내기 전에 먼저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알고 나서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다. 남이 지어주는 아파트에 몸만 옮겨 다니다가 생전 처음 내손으로 집을 짓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가꾸고 싶어서 몸이 달아 있다.
그러나 자연은 도망가지 않는다. 1년 동안은 황토마당을 그대로 밟고 견뎌라. 잔디 때문만은 아니다. 나무를 심는 일도 그렇다. 맨땅으로 사계절을 지내보면 내 집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들의 나무와 풀들이 연출하는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그 파노라마가 조경의 교과서다.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주변에 어떤 꽃들이 피고 지는지 알아야 한다. 사계절을 지내봐야 가장 잘 자라는 나무가 어떤 것이고 어떤 꽃을 심어야 주변과 조화가 되는지 가늠이 된다. 잡초도 어느 구석에서 어떤 놈이 잘 올라오는지 알게 된다. 땅은 그때까지 기다려준다. 사람이 기다리지 못할 뿐이다.

■“이웃과 고립되면 전원생활도 실패”
마당을 가꾸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시골 문화를 이해하고 시골 생활에 적응하는 일이다. 적어도 집 바깥의 일은 시청에서 해결해 주는 도시생활과 담장 안팎의 일을 모두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전원생활은 문화적으로 완전히 이질적인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에 부풀어 전원생활에 도전했다가 좌절하고 다시 돌아온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시골생활에 대한 적응 실패가 대부분이다. 특히 현지 주민과의 갈등으로 전원 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은 “순박한 줄 알았더니 시골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이런 전제 자체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종종 겪는 일이지만, 전원주택에 살다보면 도시사람들의 몰상식한 행동에 어이없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주인이 버젓이 마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무 양해도 구하지 않고 불쑥 대문 안으로 들어서거나, 현관까지 바로 쳐들어오기도 한다. 엄연히 사유지인 마당을 아무나 발을 들여놓는 공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색하고 나무라면 ‘시골 인심이 더 무섭네’라고 눈을 흘긴다. 서울 한복판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하면서 ‘시골이니까…’라고 가볍게 생각한다. 이런 사소한 일을 통해서 시골사람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다. 시골이 순박하기를 바란다면 스스로도 먼저 순박해야 한다.

최근에 은퇴하고 과수원을 사서 시골로 내려갔던 친구는 마을에서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돈다는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랐다. 낯도 설고, 처음 접한 과수원 일에 치여서 이웃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몇 달을 지냈더니 ‘사람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마을 어른들과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오해를 풀고 나서야 사면을 받고, 과수원일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훈수를 받을 수 있었다.
시골은 열린 공간이면서 동시에 닫힌 공간이다. 안보는 것 같아도 모두가 보고 있다. 그 시선을 외면하면 고립된다. 이웃으로부터의 고립이 도시에서는 일상이지만, 시골에서는 생활 자체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피곤해진다. 그 출발점은 땅과 집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마을 사람들은 땅과 집을 가꾸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 땅 앞에서 겸손하면 마을 사람들의 보는 눈도 달라진다.
글= 이광훈 드림사이트코리아 C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