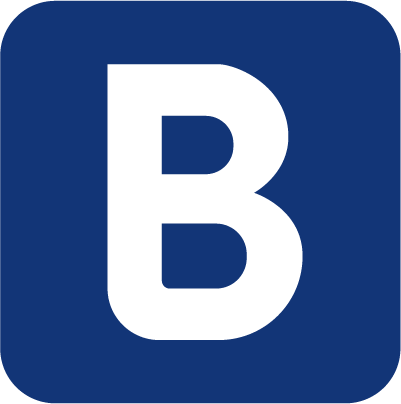[디카폐인] 캄보디아의 '마대자루' 형제
캄보디아의 최대 항구도시인 시아누크빌. 세계 7개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앙코르와트와 더불어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명소다. 지금이야 호텔, 카지노가 들어선 관광지로 떠올랐지만 몇 년 전 방문했을 때는 물과 풀밖에 없는 어촌 마을이었다.
배를 타고 시아누크빌 주변을 둘러본 뒤 하선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다리고 있었다. 머리 주변에 헤어드라이어를 세 대쯤 틀어놓은 듯했다. 지쳐서 좀 쉬고 있을 때 현지 어린이들이 눈앞을 지나갔다. 둘 다 꾀죄죄한 모습이었다. 한국이라면 버려진 옷도 녀석들이 입은 옷보다 나았으리라.
큰아이는 이제 일곱 살쯤, 동생은 다섯 살쯤 됐을까. 눈이 마주치자 큰아이가 “헬로 써(Hello, sir)”라고 인사를 건넸다. 뒤를 따르는 동생도 내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무척 밝은 표정. 티 없이 맑다는 표현 그대로였다. 나는 눈인사로 대신했다.

좀 이상했다. 둘 다 자신의 몸만큼 커다란 마대 자루를 메고 있었다. 호기심에 안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다. 고철이나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 따위의 물건들로 가득했다. 폐품이었다. 바닷가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주운 듯했다. 아이들의 가정형편을 짐작할 수 있었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그들은 구걸하지 않았다. 보물이라도 쥔 양 자루를 꽉 잡고 작은 다리를 움직여 어디론가 부지런히 걸어갈 뿐이었다. 한국이라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뛰놀 나이.
왠지 가슴이 아파서 아이들을 불러 세웠다. 카고팬츠 주머니에 넣어둔 미니 초코바를 꺼냈다. 1개뿐이었다. 더위에 녹아 흐물흐물해진 것이 느껴졌지만 달리 줄 것이 없었다. 큰아이가 자루를 내려놓고 초코바를 받더니 두 손을 모아 “땡큐 써”라고 인사했다. 학교에 다니는 것 같지 않았지만 인사성도, 예의도 무척 바른 아이였다. 다시 갈 길을 가는 두 아이.

“식사하러 갑시다!” 뒤에서 가이드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곧 점심시간이었다. 식당으로 가면서 뒤를 돌아봤다. 형이 초코바 껍질을 까서 동생에게 주고 있었다. 더위에 녹아 껍질에 눌어붙은 초콜릿이 주우욱 늘어졌다. 형은 하나도 먹지 않고 동생에게 모두 주고 있었다. 멍하니 바라보다 가이드의 재촉에 발길을 돌렸다.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자 순간 이동이라도 한 듯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펑펑 나오고 있었다. 직원들은 모두 나와 친절하게 우리 일행을 맞이했다. 식탁 위에는 현지 음식과 한국 음식이 조화를 이룬 만찬이 펼쳐져 있었다.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옆 식탁에서는 하얀 옷을 입은 한국인 여자아이가 반찬 투정을 하고 있었다. 어째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혹시나 해 창밖을 내다봤지만 형제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눈앞에 아이들의 밝은 미소가 아른거렸다. 그날 식사에서 난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했다.
By 에디터 김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