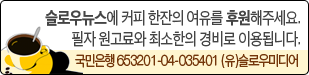어머니와 밥
몇 년 전 한 여성 소설가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아담한 정원이 있는 단층 양옥집으로 찾아갔다. 거실 책꽂이 한 칸에는 무슨 무슨 문학상 상패들이 나란히 놓여있었다. 집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설은 주로 밤 10시부터 새벽 3~4시까지 쓴다고 했다.
그에게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새벽까지 글을 쓰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척 괴로웠던 터라 개인적인 질문이라며 아이 아침밥은 어떻게 해주느냐고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아침밥 안 먹는 아이로 키우면 돼요.”
그 초월적이고 독자적인 답변에 정신이 번쩍 났다. 그리고 곧 알아차렸다. ‘밥’의 탈을 쓴 저 사사로운 질문이 얼마나 정치적인가를. 남자는 돈 벌고, 여자는 (일해도) 살림한다는 이성애적 성별 분업 구도에 따른 ‘닫힌 질문’을 던진 것이다.
창피하고 그만큼 부러웠다. 밥을 안 하는 것보다 밥 안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공표’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비록 아침 식사에 국한하지만, 요리와 육아를 거부하는,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엄마의 모습은 낯설고 기이하고 커 보였다. 같은 시기에 나는 어느 남성 평론가의 평론집을 읽었는데 서문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
“어머니가 해주신 밥 먹으면서 이 글들을 썼다. 어머니가 쓰신 책이므로, 어머니께 드린다.”
참으로 빤하고 오래된 각본처럼 진부했다. 어머니를 밥하는 존재로 못 박는 듯해 갑갑했다. 700쪽이 넘는 두툼한 책의 현란한 문학적 수사와 이론적 분석에 압도될수록 나는 어머니의 밥이 떠올랐다. 한 사람이 이 정도 지적 과업을 달성하기까지 동 시간대에 이루어졌을 700그릇 이상의 밥을 짓는 한 사람의 ‘그림자 노동’이 아른거렸다.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라는 말은 완고하다. 어머니를 어머니로 환원하는 가부장제의 언어다. 인습을 의심하고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문학의 본령을 거스르는 말이다. TV 아침 프로그램에 나오는 중년 탤런트의 “아들 아침밥은 꼭 차려주는 며느리를 맞고 싶다.” 같은 류의 발언에 더 가깝다.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당연시할 확률도 높을 테니까 말이다. 아침밥 안 먹고 자란 아이는 (전문가의 경고대로 학습력이 저하될지언정) 아침에 해가 뜨듯 밥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적어도 알지 않을까 싶다. 이걸 모르는 어른이 의외로 많다.
요즘 ‘집밥’이 화제가 되는 걸 보면서 나는 오래 전 저 어머니와 밥의 삽화들이 떠올랐다. 지금 나는 ‘아침 안 먹는 아이로 키우는 소설가 엄마’보다는 ‘밥 차려주는 어머니’에 해당하는 순응적인 일상을 겉으로는 살고 있지만 속으로는 끼니마다 회의한다.
나에게 밥은 집밥이냐 외식이냐, 레시피가 간단하냐 복잡하냐, 맛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그 밥을 대체 ‘누가’ 차리느냐의 문제다. 최승자 시인의 시구대로 우리는 “채워져야 할 밥통을 가진 밥통적 존재”이고, 누군가 차리지 않은 그냥 밥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엄마들은 어디 효도관광이라도 가서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매 끼니 밥이 나오는 신비”를 경험한다.
그제야 맛본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을.